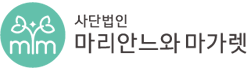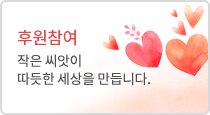언론보도
 > 소식과 이야기 > 언론보도
> 소식과 이야기 > 언론보도(2017.05.07.가톨릭평화신문)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한센인 위해 일생 바친 두 천사, 감동 실화 40여 년만에 다큐로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
1960년대 파견 간호사로 소록도 온 뒤
70대까지 봉사하다 오스트리아로 귀국
고마움 전하고자 영화 기획 결심
상영관 확보 어렵지만 최선 다할 것
1960년대 파견 간호사 자격으로 소록도 땅을 밟은 오스트리아 여성 두 명이 있었다. 두 여인은 파견 기간이 끝난 후 70대가
될 때까지 봉사하고 2005년 홀연히 고국으로 떠났다. 바로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푸른 눈의 두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다.
두 간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기획한 소록도본당 주임 김연준 신부(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 대표)
에게 영화의 의미를 들어봤다.
▶영화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분이 떠나셨던 2005년 11월에 소록도본당 보좌 신부였다. 떠나는 당시 상황을 알기에 가슴이 아팠고 죄송했고 부끄러웠다.
수녀님으로 잘못 알려져 두 분이 떠날 때 많은 사람이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시면 수녀원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다. 사실 두 분은 평신도였고 일흔이 넘은 나이에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간 거다. 원래는 소록도에 뼈를 묻겠다고
했지만 마리안느씨는 대장암에 걸리고 마가렛씨도 노쇠해지면서 떠나기로 결심한 거다. 2013년 소록도본당 주임 신부로
부임했는데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영화를 기획하게 됐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모습을 보고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두 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어떻게 지내나.
가족은 있지만 아픈 할머니가 빈손으로 온다면 누가 환영해주겠나. 마가렛씨는 치매기도 있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서 지낸다.
사실 우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평생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 노후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오스트리아 주한국대사관이 올해 6월 영화 시사회를 열어달라고 우리를 초대했다. 그때 가는 길에 두 분을 만나 영화를 꼭
보여드릴 생각이다.
▶영화 제작에 어려움은 없었나.
당연히 많았다. 두 분은 40여 년간 인터뷰를 하지 않은 분들이다. 기자들을 반겨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기사에 나오는 것을 정말
꺼려했다. 재작년에 처음 오스트리아로 감독과 스텝이 촬영을 갔는데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나중에는 마음을 열어줬고, 감독도 두 분을 배려해가면서 최대한 그분들의 마음을 존중해서 촬영했다.
▶상업 영화에 밀려 상영관이 적은 편이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다.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극장에 올리는 게 더 힘든 것 같다. 발로 뛰어 몇 군데를 열고 홍보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영화관 상영이 끝나면 DVD 출시도 고려하고 있지만 극장에서 봐야 느끼는 감동이 크기 때문에 상영관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오스트리아에도 영화를 배급하고 싶다.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나.
세상이 갈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다. 뉴스를 봐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나쁜 소식이 주를 이룬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듯하다. 하지만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은 달랐다.
두 분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 점을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었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