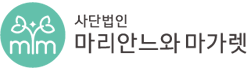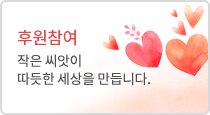언론보도
 > 소식과 이야기 > 언론보도
> 소식과 이야기 > 언론보도기사를 쓰다 갑자기 '킥킥' 웃음이 나올 때가 있다. 취재차 촬영한 화면 가운데 뉴스에 나가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
원본은 아카이브에 저장하는데, 그 영상을 찬찬히 보다 보면 기자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동이 찍혀있을 때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담긴 내 모습을 확인하고 신기해서 웃는 거다.
몰랐는데, 난 늘 왼쪽으로 턱을 괴고 인터뷰이의 말이 길어지면 초조해져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360도로 휙휙 돌린다.
또 상대에게 질문할 땐(마치 유치원 교사처럼) 설명을 위해 양손을 많이 사용한다.
가끔씩 생기는 재밌는 일은 또 있다. 취재 중에 (좋은 의미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스쳐 지나고 말았을
그 찰나의 순간이 영상에 담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만 존재할 뻔 했던 어떤 사건이 기록으로 남아 두고두고
볼 수 있게 되는 거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 “살아있는 천사를 만나고 오니 어때?”
소록도병원 개원100주년 취재차 출장을 다녀온 내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천사는 마리안느 수녀님이다.

소록도 마리안느 수녀
43년 동안 소록도병원에서 수많은 한센인의 아픔을 받아내고 위로해준, 말 그대로 천사 같은 분이다. 긴긴 세월동안 그토록 많은 요청에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분인데, 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신 것이다. (수녀님 성격에)
말 그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수많은 기자들이 소록도로 향했다.
기자회견은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10년 전, 고국으로 돌아간 뒤 첫 방문이기에 수녀님의 한국말은 조금은 어눌했고,
그래서 조금은 알아듣기 어려웠다. 하지만 여느 진정성 높은 사람의 말이 그러하듯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따뜻했고 진했다.
● “하여튼 (기자들이) 거짓말도 하고”
갑자기 수녀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자, 옆에 앉아 마이크를 들어 돕던 오랜 한국인 친구(이자 소록도병원의 간호사)분이
다급한 나머지 수녀님의 팔을 '찰싹'하고 때렸다. ‘으이구 이 사람아, 그런 말은 뭣 하러 해.’
흡사 이런 말이라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방청객처럼) 그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소리 내 웃었다.
수녀님이 언급한 ‘기자들의 거짓말’은 다른 게 아니라 ‘대체 왜 나를 훌륭한 사람인 양 포장하느냐’는 것이었다.
“하루하루 사는 걸 목적으로, 내일에 대한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사는 목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살았더니 43년이 지났어요.”
“하여튼 간호로서 그렇게 일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왜 지금껏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인터뷰, 하여튼 우리 특별한 거 안했으니까 그렇게 (우리에 대해) 알 필요 없어요.”
수녀님은 기자회견 내내 ‘하여튼’, ‘특별한 일 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43년이 된 거예요’ 같은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말인 즉슨, 나도 내가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다, 한 5년 있다 가야지 했는데,
주어진 일 하며 (한센인)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 있더라, 왜 당신들이 나에게 이 정도로 관심을 쏟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좋아서 이렇게 살았던 거지 어떤 거창한 계획이 있던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였다.
시쳇말로 정말 ‘쿨(cool)내 나는’ 할매였다.
“내가 파상풍에 걸려 독방에 있을 때야. 아주 더운 여름이었는데 새벽같이 마리안느가 들어와선 입을 '아' 벌리라고 하더니
우유를 한 방울씩 떨어트려 먹여 주더라고.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 그러더니 나한테 한센병도 걸리기 어려운
병인데 파상풍까지 걸렸냐고, 이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라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

”실제 소록도병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녀님의 삶은 결코 (본인 주장처럼) 평범하지 않았다.
한센인들은 자신도 쳐다보기 힘들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던 수녀님을 진정한 성인(聖人)으로 기억한다.
누구도 한센인에게 다가서려 하지 않았던 그 옛 시대에, 비닐장갑 하나 끼지 않은 채 밤낮으로 간호해줬다고 한다.
마리안느는 그렇게 43년 동안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봉사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려 간호가 필요하자
주변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홀연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친구) 마가렛도 같이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우리도 진짜 결정하는 거 떠나는 거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교님, 신부님,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 이틀 전에 했어요. 그
래서 하여튼 (한센인) 친구들한테도 조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너무 무겁고, 또 아프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결정했었어요.
우리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날.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모르고 나중에 조금 전화하면서 편지하면서 설명해줬어요.”
30분 가량의 기자회견을 끝낸 마리안느가 환하게 웃으며 친구와 손을 꼭 붙잡고 복도로 나섰다.
뭔가 아쉽고 충분치 않은 느낌이었다. 슬며시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 SBS 류란 기자....” '혹여나 불편해하시면 어쩌지? 그런 기색이 보이면
냅다 뒤로 물러서 사라져야겠다(?)'고 다짐하던 그때,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따뜻하고 묵직한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나로선 ‘잡힌’ 거였다. 그러더니 내가 처음부터 동행인이었던 양 몸을 끌어당겨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마리안느의 왼손은 친구가, 오른손은 내가 잡고 있었다. 덕분에 옆에서 그렇게 같이 걸으며 한번 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도 마리안느는 본인 고생한 이야기 좀 해달라는 질문에 '한센인 친구들이 참 힘들었다'는 말만 반복했다.
두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영상기자 선배에게 손이 잡힌 모습이 담겼는지 확인을 부탁했다.
'너무 급작스럽게 따라간 거라 프레임에 그 모습까진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였다. 하지만 생생히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은 8시 뉴스에 방영됐다.
'잘 생긴 남자한테 잡힌 것도 아닌데', 난 그 후로 몇 번 혼자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히죽히죽 웃었다. 손이 잡힌 느낌이 되게 생경했던 게, 그러니까 난 그날 그녀가 만난 수많은 기자 중 한 명일뿐,
우린 따로 어디서 인사 한번 나눈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마리안느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인사를 건네자 ‘응, 그래. 너 왔어?’ 이렇게 답하는 느낌으로,
내가 누군지 확인하려 곁을 돌아보기 전에 손부터 잡았다. 그 날 그 리포트를 본 누군가는 할머니와 손녀 사이 같았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다정한 친구 사이 같았다고 했다.
대단한 사람이고 천사 같은 사람이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연도 닿은 적 없는 낯선 누군가와 경계심 없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건, 무엇이든 편견없이 껴안을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난 반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세상이 외면했던 타국의 병자들을 껴안고 어루만지며
돌볼 수 있었을 거다.
마리안느라는 사람을 단 몇 초 안에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감동적인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있어
나는 두고두고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굉장한 행운이다!)
출처 : SBS 뉴스